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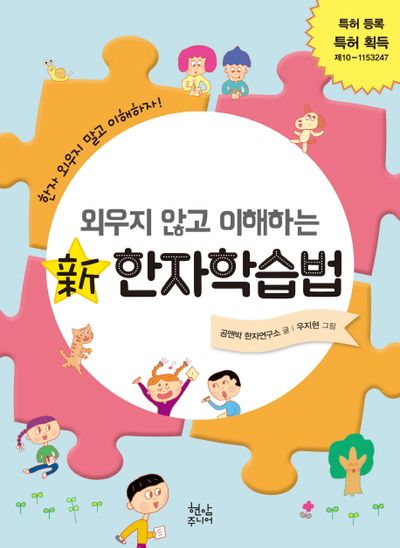
한문(漢文) 학습(學習)의 필요성(必要性)과 그 방법(方法)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硏究)해왔다. 또한 전문분야(專門分野)에서 한문(漢文)을 빼면 시체(屍體)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重要性)이 강조(强調)되어 왔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硏究)를 하면서 그 방법론(方法論)을 찾는 과정(過程)을 거치게 되었다. 연구분야(硏究分野)에서는 한문 해석(漢文解釋)에 대한 정석(定石)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항상 한문(漢文)은 언어(言語)라는 점을 명심불망(銘心不忘)해야 한다.
한문을 배우려면 우선 먼저 사서(四書)이다. 사서(四書)는 공식(公式)을 적용(適用)할 정도(程度)로 문법(文法)에 딱맞는 문장(文章)들로 이루어졌다. 수없는 숙독상미(熟讀詳味)와 소화(消化)를 해서 토(吐)를 달고 언해(諺解)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배우기에도 쉽다는 이점(利點)이 있다. 그러면 왜 소학(小學)을 먼저 배우지 않는가? 물론 소학(四字小學)은 언해(諺解)도 달려있고 어려운 단어(單語)가 많아서 나중에 전문서적(專門書籍)을 읽을 때에 꽤 도움이 된다. 그러나 소학(小學)은 유교적(儒敎的)인 예절(禮節)과 법도(法度)에 대하여 써 놓은 책이다. 한편 사서(四書) 가운데 가장 유학(儒學)의 대의(大義)를 잘 설명(說明)하고 있으며, 문법(文法)에 잘 맞는 것이 맹자(孟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맹자(孟子)를 배우는 것에는 충분(充分)한 이유(理由)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음 맹자(孟子)를 배우는 사람은 매우 큰 혼란(混亂)에 빠질 수 있다. 뜻은 이해(理解)가 가면서도, 성독(聲讀)을 하면 우리말로 된 주문(呪文)을 외우는 기분(氣分)이다. 즉 가장 힘든 것이 성독(聲讀)이다. 억양(抑揚)이라는 것이 어조(語調)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理解)를 해야만 했는데 거기에 대해 쓰여진 책이 없다. 또 부사(副詞), 연결어(連結語), 한자단어(漢字單語), 그리고 '토(吐)'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문장(文章)의 미묘(微妙)한 어감(語感)을 표현(表現)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상황(狀況)에 쓰이는 지를 알기 어렵다. 그런 것들은 일반 사전(辭典)에서는 안나왔다. 뿐만아니라 토(吐)를 어떻게 해석(解釋)하느냐도 문제(問題)었다. 한번 맹자(孟子)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로니’, ‘-로소니’, ‘-로리니’ 등등 비슷한 토(吐)가 연거푸 나오게 되면 머리가 여간 혼란(混亂)스러워지는 게 아니다. 또 잘 외워지지도 않는다. 결국(結局)에 가서는 막무가내(莫無可奈)로 외우지(誦) 않으면 안되는 게 사실(事實)이다.
1. 한문은 언어이다.
한문(漢文)은 포괄적(包括的)으로 언어학(言語學)의 범주(範疇)에 속한다. 그 속에 ‘한문학’, 국어(國語)의 '고문법(古文法)’, 중문학(中文學)의 ‘고대 한어’ 부문(部分)이 구체적(具體的)인 범주(範疇)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重要)한 것은 한문(漢文)은 언어이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는 것이 지론(至論)이다.
♣한문을 배우려면 聲讀을 하면서 익혀야.
성독(聲讀)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구결(口訣)을 공부해 두어야 한다(구결이 필요없다는 사람도 많다). 구결(口訣), 즉 토(吐)를 다는 것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두(吏讀)라는 형식(形式)을 빌어 유래(由來)되었다.
허사(虛詞)만 가지고 한문(漢文)을 읽는 것은 매우 부자연(不自然)스럽고, 문맥(文脈)이 끊어지도록 읽는 방법(方法)이 희박(稀薄)했다. '구결(口訣)없이도 읽는 방법(方法)은 사성(四聲)을 맞추어 읽는 방법(方法)이다'.
반면에 구결(口訣)을 붙여 성독(聲讀)을 할 때는 여러 잇점(利點)이 있다.
첫째, 의미단위(意味單位)를 끊어서 읽기(讀)가 쉽고,
둘째, 그로 인해 읽는 가운데 대강(大綱)의 뜻을 이해(理解)할 수 있으며,
세째, 구결(口訣)을 붙임으로써 리듬(拍子)을 맞추어 읽기 때문에 외우(誦)기가 쉽다.
구두점(句讀點)을 찍는 것과 비교(比較)하면, 구두점(句讀點)을 찍어두면 문장(文章)의 구별(區別)과 의미(意味)의 파악(把握)이 쉬워진다는 잇점(利點)이 있지만, 읽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성(四聲)에 맞추어 읽(讀)는 방법(方法)이라 해도 구두점(句讀點)은 있어야 한다'. 결론적(結論)으로 구결(口訣)은 성독(聲讀)을 위해 만들졌다. 구결(口訣)에는 불가구결(佛家口訣)과 유가구결(儒家口訣)로 나뉘어 지는데, 불가구결(佛家口訣)은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로 불경언해(佛經諺解)를 만드는 과정(過程)에서 국어(國語)의 발달(發達)과 더불어 형성(形成)되었기 때문에 고토(故吐)가 매우 많음으로 인해 배우기도 어렵거니와 전문분야(專門分野)에서 쓰기에도 곤란(困難)하다. 반면에 유가구결(儒家口訣)은 그 연원(淵源)은 불가구결(佛家口訣)에서 시작(始作)되지만, 조선시대 선조~중종조에 처음 소학언해(小學諺解)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등장(登場)했다. 이것은 매우 간략화(簡略化)되고, 정형화(定形化)되어 사서언해(四書諺解)에 쓰여졌다. 우리가 일반적(一般的)으로 배우는 사서(四書)는 이 때의 사서언해(四書諺解) 관본(官本)에 붙어 있는 구결(口訣)을 대부분 그대로 쓴 것이다. 관본(官本)은 변화(變化)가 거의 없었으며 몇백년간 유지(維持)되어 온 것이므로, 구결(口訣)을 배우는데 있어서 기준(基準)이 될 수 있다. 삼경언해(三經諺解)도 이후에 만들어 졌지만, 초습자(初學者)들은 우선 사서(四書)를 열심히 성독(聲讀)하는 것이 구결(口訣)을 배우는 기초(基礎)가 될 것이다.
2. 한문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다.
한문(漢文)은 언어(言語)의 한 부분(部分)이다. 그러므로, 형식(形式)과 내용(內容)으로 구분(區分)된다. 미리 단정(斷定)짓자면, 한문(漢文)의 형식(形式)은 허사(虛辭)와 실사(實辭)로 구분(區分)되며, 한문(漢文)의 내용(內容)은 이를 토대(土臺)로 표출(表出)된다. 우리는 형식(形式)을 통해 내용(內容)을 정확(正確)히 이해(理解)하는데에 중점(重點)을 두고 있음을 전제(專制)로 한다.
원래 한문(漢文)의 시초(始初)인 갑골문(甲骨文)에 있어서도 단락(單落)의 구분(區分)은, 횡선(橫線), 직선(直線), 정자(丁字) 모양(模樣)의 선(線) 등의, ‘계획(界劃)’이라는 형식(形式)을 통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상고시대(上古時代)의 문헌(文憲)은 전화(戰火)와 진시황(秦始皇)의 분서(焚書)로 인해 소멸(消滅)되고, 구두(口頭)로 전(傳)해지는 과정(過程)을 통해, 단락(單落)의 구분(區分)을 표시(表示)하는 형식(形式)이 소멸(消滅)되고 이것이 관습화(慣習化)되면서 구두점(句讀點)을 찍지 않게 되었다. 대신 허사(虛辭)를 통해 구두점(句讀點) 없이 문장끊기를 하였다. 그 이후, 중문(中文)은 결국 원대(元代)에 이르러서야 어조사(語助辭)라는 것이 출현(出現)하고, 어법(語法)이 차츰 수립(樹立)되게 되었다.
문제(問題). 초학자(初學者)들은 문법(文法)을 공부하되, 문맥(文脈)을 잡는 핵심(核心)을 놓치고 있다. 최근(最近)에 출판(出版)되는 중국책들은, 고대(古代)의 것이든 근대(近代)의 것이든 가릴 것 없이, 구두점(句讀點)이 찍혀 있다. 고서(古書)에 찍히는 구두점(句讀點)들은 허사(虛辭)에 의해서도 결정(決定)되기도 하지만, 허사(虛辭)없이 문맥자체(文脈自體)의 의미(意味)로써도 결정(決定)된다. 초학자(初學者)들은 허사(虛辭)가 의미(意味)하는 바를 간과(
看過)
할 뿐만아니라, 구두점(句讀點)에도 별 신경(神經)을 쓰지 않고, 단순(單純)히 단어자체(單語自體)의 의미(意味)만으로 해석(解釋)을 시도(試圖)하는 경향(傾向)이 짙다. 더우기, ‘방점(傍點)’이 없는 고서(古書)의 경우(境遇)에는 끊어읽기조차 못하는 저조(低調)한 실력(實力)을 가진 초학자(初學者)가 꽤 많다.
허사(虛辭)에 대한 구별(區別)과 그 상세(詳細)한 뜻을 알아두어야 한다. 허사(虛辭) 속에는 절(節) 사이(間)의 의미(意味)를 결정(決定)짓고 절(節)들을 구분(區分)해 주는 미묘(微妙)한 뜻이 담겨져 있다. 단순(單純)히 ‘어조사(語助辭)’라고 넘어가 버리면 문장(文章)의 미묘(微妙)한 뜻은 간과(看過)해 버리게 된다. 성독(聲讀)을 하면 어느 정도(程度) 파악(把握)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完璧)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끊어읽기에 있어서도, 근본적(根本的)으로는 문맥(文脈)에 의해 단속(斷續)되지만, 표면적(表面的)으로는 허사(虛辭)에 의해 구분(區分)되는 것인 만큼 허사(虛辭)가 쓰이는 상황(狀況)과 그 자체(自體)의 미묘(微妙)한 뜻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3. 한자는 진정 하나의 단어인가?
한자(漢字)는 형성원리(形成原理)에 따라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의 육서(六書)로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육서(六書)로써 한자(漢字)를 분석(分析)한 저작(著作)인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지은 허신(許愼)은, 한자(漢字)의 자형구조(字形構造)를 크게 두 종류(種類)로 구분(區分)하였는데, 하나는 형체(形體)를 뜯어 분리(分離)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分離)시킬 수 없는 것, 또는 분리(分離)시켜 놓고 나면 독립적(獨立的)으로 형태(形態)를 이룰 수 없다. 전자는 상형(象形), 지사(指事)로 설명(說明)하였으며, 후자는 회의(會意), 형성(形聲)으로 설명(說明)하였지만, 전주(轉注)와 가차(假借)에 대한 구체적(具體的)인 설명(說明)은 략(略)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轉注)는 한가지 의미(意味)를 자형(字形)이 비슷한 여러 글자로 표현(表現)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言語)의 번식(繁殖)이라는 측면(側面)을 가지고 있으며, 가차(假借)는 새로운 의미(意味)를 기존(旣存)의 한자(漢字)로 표현(表現)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言語)의 소멸(消滅)이라는 측면(側面)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한자(漢字)는 하나하나가 독특(獨特)한 의미단위(意味單位)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제가 내린 결론(結論)은 한자(漢字)는 분명(分明) 육서(六書)에 충실(充實)하게 해석(解釋)되어야 하며, 하나의 한자(漢字)라 하더라도 ‘단어절(單語節)’이 될 수 있음을 늘 염두(念頭)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초학자(初學者)들은 대부분(大部分) 육서(六書)를 무시(無視)하고 단어(單語)의 음(音)과 뜻(意)만을 가지고 해석(解釋)한다. 소수의 초학자(初學者)들은 한문(漢文)에 있어서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意味)를 정확(正確)히 살려서 해석(解釋)해야 한다는 인식(認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具體化)되기까지는 많은 준비작업(準備作業)을 선행(先行)
해야만 한다. 그 증거(證據)로, 많은 초학자(初學者)들이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를 대량 구입(購入)한 상태(狀態)이지만, 이에 대한 색인(索引)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찾기를 포기(抛棄)한 이들이 대부분(大部分)이다. 더구나, 대부분(大部分)의 초학자(初學者)들은 사전(辭典)을 찾아 그 단어(單語)가 있는지 확인(確認)할 따름이지 이러한 인식(認識)조차 없는 실정(實情)이다. 총적(總的)으로 한문(漢文)을 열심(熱心)히 공부(工夫)하는 것이 현명(賢明)한 일이다. 물론(勿論) 한문(漢文)은 평생(平生)토록 하는 공부(工夫)이다.
이제, 위의 논점들을 바탕으로 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口訣
● 漢文通釋
토(吐)다는 법(法)이 상세(詳細)하게, 허사(虛辭)와 관련(關聯)지어, 구조적(構造的)으로 설명(說明)되어 있다. 예문(例文)은 많으나 주로 불경언해(佛經諺解)를 위주(爲主)로 하였으므로 어려운 부분(部分)이 많다. 부록(附錄)에 토(吐)를 한글로 풀어놓은 것이 있다. 그리고, 머릿말에 구결(口訣)을 붙이는 데에 대한 찬반(贊反)을 제시(提示)하여 놓은 것도 볼만 하다. 일반적(一般的)으로 토(吐)다는 법(法)에 대해서 써 놓은 책은, 이 책을 제외(除外)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吐)=구결(口訣)에 대해서 연구(硏究)된 바는 매우 척박(瘠薄)한 상태(狀態)이며, 이는 고문법(古文法)에 해당(該當)하는 영역(領域)이다. 토(吐)에 대한 개론서(槪論書)로서 시초(始初)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도서정보: 趙鍾業, 1994, 螢雪出版社, 9800원
☯虛詞와 句讀點
● 虛辭辭典
720 여개의 허사(虛辭)의 용법(用法)을 폭넓게, 자세(仔細)하게, 풍부(豊富)한 예문(例文)을 가지고 설명(說明)하였다. 한글 순(順)의 색인(索引)이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94년에 증보(增補)되었다. 허사(虛辭)라는 것은 각종 어기사(語基辭), 어조사(語助辭), 연결어(連結語), 부사(副詞), 조동사(助動詞) 등 직접(直接) 문장(文章)의 뜻에 기여(其餘)하지는 않지만, 문장(文章)의 민감(敏感)한 부분(部分)을 간접적(間接的)으로 표현(表現)하는 부분(部分)이다. 한문(漢文) 해석(解釋)의 관건(關鍵)이 되는 부분(部分)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에도 안 나오는 부분(部分)이 있다면, 중한사전(中韓辭典)을 찾아보시면 된다.
▶도서정보: 金元中, 1994, 玄岩社, 25000원
● 虛辭小辭典
위의 허사사전(虛辭辭典)에서 102개의 허사(虛辭)만을 추려서 간결(簡潔)하게 만든 것이다. 들고 다니기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설명(說明)이 생략(省略)된 부분(部分)이 많아서 과연 효과(效果)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도서정보: 金元中, 1995, 玄岩社, 10000원
● 醫學漢文
예2 1학기에 배우는 의학한문(醫學漢文) 뒷부분의 문법편(文法篇)은 충분(充分)히 공부할 만한 가치(價値)가 있다. 무엇을 보고 만들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위의 허사사전(虛辭辭典)과 함께 공부를 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部分)이다.
▶도서정보: 박찬국, 윤창렬 저, 成輔社, 9000원. 87.3.25초판, 92.4.20 2쇄
● 고급한문해석법 ―한문을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인가―
이 책에는 구두점(句讀點)을 찍는 방법(方法)에 관해 허사(虛辭)를 중심(中心)으로 설명(說明)하고 있다. 예문(例文)은 어렵지마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구두점(句讀點)을 찍을 것인지에 관해 논리정연(論理整然)하게 설명(說明)해 두었으므로, 결코 어려운 책(冊)이 아니다. 위의 허사사전(虛辭辭典)과 비교(比較)하면, 오히려 이 책을 추천(推薦)한다. 두 책이 모두 중국책을 해석(解釋)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내경소문(內經素問)을 전산화(電算化)하고 있다. 그런데, ‘황제내경 장구색인(黃帝內經 章句索引)’이라는 중국책으로 일단은 구두점(句讀點)을 찍을 예정(豫定)인데,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여기에서의 구두점(句讀點)을 더 첨가(添加)할 생각이지만, 전체적(全體的)인 문맥(文脈) 파악(把握)이 안되는 수준(水準)으로 구두점(句讀點)을 찍는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앞으로 많은 중국책을 접(接)해야만 하는 한의대생으로는 이 책의 숙독(熟讀)이 무조건(無條件) 필요(必要)하다.
▶도서정보: 管敏義 지음,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옮김, 창작과 비평사, 94.9.15. 초판, 95년 3판, 10000원
☯字解
● 說文解字通論
이 책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대한 이해(理解)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책으로서, 설문해자(說文解字)가 어떤 식(式)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으며, 이를 어떤 식(式)으로 이해(理解)해야 하는 지를 설명(說明)해 놓은 책(冊)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관심(關心)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冊)이다.
▶도서정보: 陸宗達 저. 金槿 역. 계명대학교 출판부. 94.10.15발행. 10000원.
● 漢字學講義
이 책은 갑골문(甲骨文)과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유래(由來)와 비교(比較)를 구체적(具體的)인 예(例)를 들어가면서 논문형식(論文形式)으로 쓰여져 있다. 그러나, 결코 지루하지 않으며, 한자의 역의(釋意)를 객관적(客觀的)인 고증(考證)을 통해 풀어보는 방법론(方法論)을 제시(提示)하고 있다. 이 책은 위의 ‘설문해자통론(說文解字通論)’과 더불어서 하나의 기준(基準)을 제시(提示)할 것이다.
▶도서정보: 최영애 저, 통나무, 95.9.28 초판, 9000원
● 甲骨文字典
삼련서점에 다른 판본(版本)으로 또 한 종류(種類)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갑골문(甲骨文)에 대한 연구(硏究)는 약 70년 정도 계속 되어 왔으며, 그 결과, 기존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한 글자풀이와는 다른 양상(樣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설(定說)이다. 갑골문(甲骨文)은 은대(殷代)에 존재(存在)하던 것이고, ‘설문해자(說文解字)’는 한대(漢代)에 지어진 것이니 엄연(嚴然)히 차이(差異)가 많이 나고, 와전(訛傳)된 부분도 많을 것이다. 이 책은 석의(釋意)를 수많은 책을 종합(綜合)해서 써 놓은 사전(辭典)이다.
▶도서정보: 徐中辭 主編, 四川辭書出版社. 88.11.초판 발행. 1613면. 77.00元. 한의대도서관 소장(412.12 서77ㄱ). 繁體字, 백화문.
● 說文解字注
이 책은 한의대생들이 많이 소장(所藏)하고 있으나, 잘 쓰이지 못하는 책이다. 부수색인(部首索引)이 현재 쓰는 체계(體系)와 다르며, 총획색인(總劃索引)에서 배열(配列)이 부수별(部首別)이기 때문에 역시 글자를 찾기가 어렵고, 음색인(音索引)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음색인만이라도 만들면, 대단히 많이 쓰일 책이다. 주(注)가 달려 있어 이해(理解)에 편(便)하다.
▶도서정보: 大星文化社. 漢·許愼 撰, 淸·段玉裁 注. 90.4.25 발행. 35000원 한의대도서관 소장(412.12 허59ㅅ).
● 說文解字
삼련서점에서 판다. 주(注)가 전혀 없으므로 간편(簡便)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도 총획색인(總劃索引)으로 찾기가 어렵고, 부수색인(部首索引)도 우리 체계와 다르며, 음색인(音索引)도 없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총획(總劃), 부수(部首), 중국음색인(中國音索引)을 수록(收錄)한 책이 삼련서점에 있다(說文解字 今讀與通檢. 10500원).
▶도서정보: 中華書局. 漢·許愼 撰. 宋·徐鉉 校定. 89.2 2쇄. 3300원 한의대도서관 소장(412.12 허59ㅅㅁ)
● 說文解字고林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대한 모든 주석서(註釋書)를 망라(網羅)해서 모은 책(冊)이다. 논문(論文)이나 방송 기자(放送記者) 또는 연구(硏究)를 할 때 참고(參考)할 수 있겠으나, 찾기에도 힘들고 양(量)도 엄청나서 일상적으로 참고하기는 불가능(不可能)하다.
▶도서정보: 丁福保 편찬. 中華書局. 88.4 초판발행. 520.00元. 총20권 한의대도서관 소장(412.12 정45ㅅㅈ).
● 金石大字典
제1권에 총획색인(總劃索引)이 있으며, 부수순(部首順)으로 배열(配列)되어 있다. 이 책은 글자의 원래 형태(形態)를 찾아보거나, 그 변천(變遷)을 파악(把握)할 때 도움이 된다. 또 서체 연구(書體硏究)를 하려면 이러한 책으로 공부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갑골문(甲骨文)은 나오지 않으며, 한대(漢代)이래의 금석문(金石文)
만 나오고 있다.
▶도서정보: 張騫 등 편찬. 中文出版社. 83.12 4쇄. 총4권. 12000엔. 한의대도서관 소장(412.12 금53ㅈ)
☯四書版本
주로 명문당(名文堂)에서 나오는 사서(四書)를 많이 보는 경향(傾向)이 있으나, 제가 비교(比較)해 본 결과(結果), 많은 오자(誤字)와 탈자(脫字)가 있는 것이 확인(確認)되었다. 아무쪼록 사지 마시길 바라며, 오히려 옛날 영인본(影印本)을 추천(推薦)하고자 한다. 보경, 여강(麗江), 학민출판사(學民出版社)에서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사서판본(四書版本)은 학민(學民)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비교해 보고 창의서림에서 살 수 있다. 그외의 사서언해(四書諺解)나 삼경언해(三經諺解)는 보경(寶鏡)에서 나오는 책(冊)을 보라(학민에서 나오는지 확인이 안됨). 그리고, 많은 고서(古書)들의 영인본(影印本)이 학민에서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학민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입(購入)하라.
☯漢韓辭典
한한사전(漢韓辭典)을 고를 때 고려(考慮)해야 할 사항(事項)을 말씀드리겠다. 한의대(韓醫大)의 교육과정상 두고두고 쓸 수 있을 정도(程度)의 많은 한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자(漢字) 해석(解釋)에 필수적(必需的)이므로 한자어가 될 수 있는 한 많아야 한다. 이는 문장구조(文章構造)를 확실히 구분(區分)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要素)이기 때문이다. 들고 다니기가 편(便)해야 한다. 한문공부는 늘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거나, 크면 한문공부를 하기도 전에 질리게 된다. 글자체가 눈에 편해야 한다. 장시간 보아야 하고, 글자를 빨리 찾아야 하므로, 글자가 너무 적거나, 세로 쓰기라든가, 줄이 너무 많으면 매우 불편(不便)하다.
● 漢韓大辭典
지금 나오는 사전 가운데 표제자(標題者)가 가장 많은 사전(辭典)이다. 색인(索引)은 모두 구비(具備)되어 있으므로 찾기는 어렵지 않다. 값이 비싸서 계를 드는 것이 좋겠지만... 표제자가 별로 없어서 해석(解釋)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도서정보: 명문당. 84.10.30 초판. 120000원. 91년 재판. 표제자 5만자 이상.
● 東亞漢韓大辭典
현재 나오는 대사전류(大辭典類) 중에서도 편집(編輯)과 내용면(內容面)에서 단연 최상(最上)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기는 동아 새한한사전을 4개 들고다니는 것과 같으므로, 들고 다니는 것은 포기(抛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저는 이 사전이 손떼가 쌔까맣게 묻어서 너덜너덜한 것을 목격(目擊)한 적이 있다. 자해(字解)가 상세하여, 잘 쓰이지 않는 것까지 잘 써놓아서, 허사사전(虛辭辭典)이나, 중한사전(中漢辭典)을 안 보고도 웬만큼 다 해석(解釋)이 가능하다. 제가 한의학(韓醫學) 서적(書籍)을 해석할 때는, 이 사전으로 주로 공부한다. 어려운 단어들이 모두 이 사전으로 풀려진다. 예문(例文)에는 소문(素問)에서 나온 것도 있다.
▶도서정보: 동아출판사. 65000원. 표제자 25000字이상. 표제어 13만5000여개. 82.10.20 초판 발행. 95.1.10 11쇄.
● 東亞 漢韓 中辭典
크기는 동아한한대사전(東亞漢韓大辭典)의 절반정도. 동아한한대사전보다는 휴대하기에 훨씬 편하다. 할 수만 있다면 동아 새한한사전(漢韓辭典)보다는 이 사전을 쓰는 것이 좋다. 약간 무거워지지만 한자단어가 10만이면 동아한한대사전과 맞먹는 수준(水準)이다. 그리고 한의대에서 쓰는 한자는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된다.
▶도서정보: 동아출판사. 40000원. 표제자15000자. 표제어 10만. 1557면. 87.1.10 초판, 95.1.10 9쇄발행. 사성표시 있음. 부수색인은 세로편집.
● 東亞 새 漢韓辭典
자해(字解)가 좋다. 예문이 비교적 쉽고 적절(適切). 분량(分量)이 많으면서도 부피가 중사전 정도(程度)다. 같은 크기의 중사전들 가운데 표제자(標題字)와 표제어(標題語)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
▶도서정보: 동아출판사. 24000원. 표제자 14500자, 표제어 6만. 2432면. 가로쓰기 2단편집. 90.1.10초판. 95.1.10 6쇄발행.
● 漢韓大字典
글씨가 매우 작지만, 한자어가 많이 수록(收錄)되어 있는 것이 장점(長點)이다. 또 예문(例文)이 사서(四書) 등 주요 문헌을 참고로 하고 있어 기본적인 한문공부에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한의학서적을 읽을 때에는 12000字로는 부족(不足)하다.가장 많이 보급(普及)되어 있는 사전이지만, 별로 권(勸)하고 싶지는 않다.
▶도서정보: 민중서림. ₩22000. 1511면. 세로쓰기 3단편집. 66년 초판. 94. 1. 10 28쇄. 표제자12000字, 표제어가 많다. 四聲표시 없음.
● 漢韓 最新標準玉篇
▶도서정보: 理想社. 95년판. 18000원. 세로쓰기. 1197면. 총획색인과 음색인은 가로쓰기. 표제자 약 3만자. 사성표시있음.
● 漢韓 最新實用玉篇
▶도서정보: 理想社. 95년판. 13000원. 세로쓰기. 926면. 총획색인은 세로쓰기 4단편집. 부록으로 한자쓰는 순서. 음색인. 동의어일람. 인명용한자.
● 漢韓 最新理想玉篇
▶도서정보: 理想社. 95년판. 16000원. 세로쓰기. 1070면. 총획색인은 가로쓰기. 부록으로 한자개설. 한자쓰는 순서.인명용한자)
이상사(理想社)에서 나오는 사전은 형식(形式)이 위의 세가지가 있는데, 자해(字解)만이 한자 및 한글로 달려 있고, 표제어는 거의 없다. 많이 보아온 사전이지만, 이번엔 음색인(音索引)이 삽입(揷入)되어 무척 편해졌다. 비록 중사전(中辭典)이지만 대사전(大辭典)만큼의 글자가 실려있으나, 한자단어가 없어 해석(解釋)에는 지장이 많다.
● 뉴에이스 한한사전
허사(虛辭)에 대한 설명(說明)이 있으나, 허사사전(虛辭辭典)보다는 자세(仔細)하지 않다. 예문은 없거나 매우 어려운 책에서 발췌(拔萃)한 것이라 보기가 힘들다.
▶도서정보: 95.1.10 3쇄. 19000원, 1978면. 금성교과서. 사성표시 있음.
● 동아 현대 한한사전
소사전류(小辭典類)에서는 가장 나은 것 같다. 들고다니면서 단어(單語)를 외우시려면 이 사전을 추천(推薦)한다. 외울때 쓰는 것이니 만큼 자기의 취향(趣向)에 맞추어 사는 것이 좋다.
▶도서정보: 80.1.1 초판. 96.1.10 16쇄. 표제자 5679, 표제어 5만, 11000원. 동아출판사
☯漢語辭典
순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사전(辭典)들이다. 7만~10만 정도의 표제어(標題語)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문의 어원(語源)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장점(長點)이 있다. 사전에 나오는 한문들은 거의가 쉬운 것들이므로, 약간의 소양(素養)만 있으면 충분(充分)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들은 거의가 색인(索引)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찾기도 쉬울 것이다. 대부분의 한의대생들이 즐겨 사는 책이지만, 역시 장서 효과(藏書效果)를 톡톡히 하고 있는 책들이기도 하다. 이 사전은 자해(字解)를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만 사기 바란다. 처음에 나오는 사원(辭源)을 주로 추천(推薦)하겠다.
● 辭源(수정본)
사원(辭源)은 재판(再版)을 거듭하면서 수정(修正)도 하여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번에 나온 사원(辭源)은 매우 보기 좋게 편집(編輯)되어 있다. 87년 축인본(縮印本)으로 1권짜리가 있지만, 대개 축인본은 글씨가 매우 작아서 보기에 곤란(困難)한 단점이 있다.
▶도서정보: 商務印書館, 전2권, 1915초판, 91.12 수정2판, 152.00元, 繁體字, 부수순, 총획·부수·중음색인, 97024條, 한의대 도서관 소장(R 412.3 상37ㅅ4)
● 辭海(縮印本)
외국어-중문 색인, 음색인(音索引), 부수순(部首順) 배열(配列), 총획색인(總劃索引), 도량형(度量衡) 등의 부록(附錄)이 있다. 축인본(縮印本)이라서 보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위의 사원(辭源)과 같은 형식(形式)으로 되어있다.
▶도서정보: 89년판을 縮印. 上海辭書出版社. 90.12 초판. 번체자. 93.12. 9쇄. 98元. 한의대 도서관 소장(R 412.3 사92ㅅ)
● 漢語大辭典(海外版)
간체자(簡體字)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힘들다. 글씨는 볼만 하다. 색인(索引)은 별책으로 되어 있다. 총획색인(總劃索引)과 음색인(音索引)이 있다.
▶도서정보: 羅竹風 주편, 三聯書店. 94.8. 초판, 부수순, 간체자. 8만여 條. 한의대 도서관 소장(R 412.3 나77ㅎ)
● 漢語大字典(縮印本)
가차(假借) 문자표(文字表), 이체자표(移替字表), 설문해자(說文解字) 등의 문헌(文憲)으로 글자의 유래(由來)를 색인화(色引化)한 것이 부록(附錄)에 실려 있음.
▶도서정보: 四川辭書出版社. 湖北사서출판사. 93.11. 초판. 110.00元. 56000여자 수록. 繁體字. 총획색인, 중음색인. 한의대 도서관 소장(R 412.32 한63ㅎㄱ)
☯中韓辭典
● 中韓大辭典
드디어 나왔다. 중한대사전(中韓大辭典). 엄청난 표제어(標題語)를 수록(收錄)하고 있다. 표제어가 많기 때문에 중국책을 번역(飜譯)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의대에서 본초책(本草冊)을 번역할 때 꼭 필요(必要)한 책이다. 그러나, 일반 한의대생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단, 동아한한대사전(東亞漢韓大辭典) 대신(代身)에 이 사전으로 공부하실 분은 선택(選擇)하셔도 무방(無妨)하다. 아래의 중한사전(中韓辭典)에 비해 글씨가 더 크므로 보기가 좋고, 전문어(專門語)와 학술어(學述語) 등의 단어가 많이 수록(收錄)되어 있다. 이 책도 곗돈을 타서 사는 것이...
▶도서정보: 표제자 17128, 표제어 30만자. 95.2.15 초판. 180000원.
● 中韓辭典
표제어(標題語)를 간체자(簡體字)로 표기했다. ‘진명 중한대사전’과 비교해서 간체자(簡體字)를 익히기에 쉬울 수도 있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추천(推薦)하는 사전이다. 진명(進明)출판사 것과 비교(比較)하면 표제어가 간체자(簡體字)로 표기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서정보: 89.10.25 초판. 95.8.5 정정판.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 편찬실 편. 표제자 14924자. 표제어18만 개. 58000원
● 現代 中韓辭典
‘중한사전(中韓辭典)’의 반 정도(程度)의 두께로 휴대하기가 편하다. 중국어 공부하는 데는 이 사전(辭典)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다.
▶도서정보: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 편찬실 편. 표제자 10289자(간체자+번체자+이체자). 표제어 9만개. 90.2.25 초판. 95.3.25 4판. 29000원
● 進明 中韓大辭典
표제어가 번자체(繁體字)로 되어있어 찾아보기는 쉽다. 그러나, 나중에 중국서적을 해석(解釋)할 때에는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구입(購入)하라. 우리의 한자에 대한 인식(認識)이 간체자(簡體字)가 아니라 번자체(繁字體)로 되어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훨씬 나은지도 모르겠다.
▶도서정보: 進明出版社. 50000원. 93.12.15 초판. 中國常用漢字 5401자, 次用字 7650자, 字典에서 9217자, 俗字와 異體字1446자, 간체자 3872자(대표자 9217자 뒤에 표기). 繁體字로 표기. 표제어 16만개.
☯韓醫學 관련 用語辭典
● 漢醫學辭典
이 책은 ‘中醫名詞述語選釋’(아래에 설명)이라는 책을 번역 편집한 것으로서, ‘한의학원론’의 체계(體系)와 같은 주제별(主題別)로 용어(用語)를 설명하였다. 음색인(音索引)도 있어서 찾기가 쉽다. 내경(內經)을 공부하실 때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된다. 기초 한의학 이론서(理論書)를 볼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도서정보: 成輔社. 전통의학연구소 편. 83.4.30 초판발행. 5000여 용어 수록. 35000원. 한의대도서관 소장(610.3 한68)
● 漢醫學大辭典 「基礎理論編」
이 책은 생리(生理), 병리(病理) 용어를 수록(收錄)한 것이나, 공부하기에는 너무 용어 수가 적다. 찾아보면 기초이론(基礎理論) 용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분과(分科) 용어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책 한 권만으로 기초이론(基礎理論) 공부시에 만족(滿足)할 만한 정보(情報)를 얻지 못한다. 차라리 한방생리학(韓方生理學) 책이나, 한방병리학(韓方病理學) 책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方法)이라 생각된다.
▶도서정보: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한의학고전연구소 편역.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발행. 18000원. 89.6.30 발행. 5778 개 용어수록. 가나다순 배열. 한의대도서관 소장(610.3 한68ㄱ)
● 한의학명사술어사전
'한의학원론'과 같은 체계(體系)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한문으로 쓰지 않고, 간체자(簡體字)는 그대로 인용(引用)하였으며, 중의학(中醫學) 용어를 써서 이해(理解)가 어렵다.
▶도서정보: 중의연구원·광동중의학원 편. 한종률·소균 역. 논장. 91.5.20 초판발행. 10000원. 한의대도서관 소장(610.952 중68ㅎ)
● 동의학사전
‘동의학(東醫學)’이란 말은 북한에서 ‘한의학(韓醫學)’을 주체적(主體的)으로 명칭(名稱)을 바꾼다는 의미(意味)에서 쓰고 있다. 한문(漢文)을 많이 쓰지 않았고, 용어가 북한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써서 이해(理解)가 어렵다.
▶도서정보: 驪江출판사. 35000원. 89.11.30 발행. 24356개 용어수록. 한의대도서관 소장(610.3 동68)
● 재편집 동의학사전
위의 ‘동의학사전(東醫學辭典)’을 재편집(再編輯), 재정리(再整理)하고, 북한말로 된 것을 다시 한의학용어로 바꾸어서 이해(理解)를 도왔다.역시 한자를 많이 쓰지 않아 이해가 힘든 면이 있다.
▶도서정보: 도서출판 까치. 90.4.15 초판발행. 24541개 용어수록. 49000원. 한의대도서관 소장(610.3 과91ㄷㄱ)
● 中國醫學大辭典(4권)
백화문(百貨文)이 아니고, 번체자(繁體字)로 적혀 있으며, 한문 형식(形式)으로 표기. 방점표시. 제4권에 총획색인(總劃索引)이 있다. 음색인이 없어서 찾기가 힘들다. 아래의 책과 동일(同一)하다.
▶도서정보: 사觀 편. 商務印書館. 총4권. 중화민국47년6월 초판발행. 중화민국70년3월 13쇄. 26元. 세로쓰기 2단편집. 한의대도서관 소장(610.3 사16ㅈㅇ)
● 中國醫學大辭典(1권)
위의 책을 축소복사(縮小複寫)하고, 재편집(再編輯)해서 만들었다. 결국 불분명(不分明)한 글자도 간혹 있게 된다. 총획색인(總劃索引) 밖에 없어 찾기가 힘들다.
▶도서정보: 사관 편. 高文社. 50000원. 70.6.5 초판발행. 세로쓰기 4단편집. 한의대도서관 소장(610.3 사16ㄷ)
● 校正 漢醫籍字典
'중의의적자전(中醫醫籍字典)'(上海중의학원·중의문헌연구소편. 89.2 출판)을 재편집하고 오자수정(誤字修正)을 해서 만들었음. 제일 앞에 음색인 있음. 끝부분에 총획색인(總劃索引) 있음. 간체자(簡體字)로 되어 있고, 백화문(百話文) 형식이다. 부수별로 나열(羅列). 복사(複寫)를 해서 그런지 인쇄상태(印刷狀態)가 좋지 않다.
▶도서정보: 金壽山 편. 醫聖堂. 91.5.30 발행. 한의대도서관 소장(412.12 김55ㅎ)
● 中醫名詞述語選釋
'한의학사전. 성보사'의 원본(原本)이다. 끝부분에 색인(索引)이 있음. 간체자(簡體字)와 백화문(百話文)으로 표기.
▶도서정보: 인민위생출판사. 73.6 초판발행. 89.12 8쇄. 한의대도서관 소장(610.4 중17ㅈ)
● 中醫名詞述語辭典
위의 책과 비슷한 책(冊)이다. 簡體字와 백화문으로 표기.
▶도서정보: 商務印書館. 중의연구원·광동중의학원 합편. 75.4 초판발행. 79.10 2쇄. 한의대도서관 소장(610.3 중68ㅈㄱ)
●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국내(國內)에서 의서(醫書)와 의가에 대해 색인(索引)으로 찾아볼 수 있는 책(冊)은 이 책 하나뿐인 것 같다. 여기에 실린 문헌(文憲), 의가명 등은 중국의학사에 관련(關聯)된 부분 밖에 없다. 한국의학사에 관한 사전(辭典)은 아직 없으니, "한국의학사(김두종 저)"를 찾아보라.
▶도서정보: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역저.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발행. 15000원. 85.9.20발행. 가나다순 배열. 한의대도서관 소장(610.3 한68)
| 더벅머리에 구레나룻이 빠져나왔다는 봉두돌빈(蓬頭突鬢)의 한자 어원 (0) | 2020.05.01 |
|---|---|
| 마음(忄)이 말씀으로 이르듯(詹) '편안할 담(憺)' (0) | 2017.06.10 |
| 人工知能의 한자유래 (0) | 2016.03.13 |